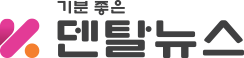강명신 교수의 New York Times 읽기
최근 뉴욕타임스에는 신경윤리학자인 매튜 라이오(Matthew Liao)뉴욕대 생명윤리 프로그램 디렉터와의 대담 기사가 실렸다. 미국이민자에게 과학이 매력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답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는 분야여서 취직하기가 비교적 낫다는 것이었다. 생명윤리 분과의 하나로 신경윤리를 규정하는 그는 fMRI(기능적 자기공명영상)가 도입돼 인지과정 중에 뇌가 어떤활동을 하는지, 뇌활동 중에 뇌의 어떤 부위가 발화하는지 알 수 있게된 것이 주효했다고 밝힌다. 이로써 과학자들은 신경의 발화지점과 특정 행동을 연관시키는 것이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과 정신을 교정하기 위한 새로운 약물이 개발돼 시험되기도 하는데 신경윤리학 과제에는 이런 가능성이 갖는 함의에 대한 고찰이 포함된다. 새로운 기술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미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오 박사가 드는 예는 프로프라놀올(propranolol)이다. 이 약제는 무대공포증 예방에 쓰이는 것으로 외과의사들이 수술시 수전증을 줄이는 데에도 사용한다고 한다. 이 약제는 기억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신경전달물질 활성을 억제한다. 현재 미국 정부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는 병사에게 시험 중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나쁜 기억을 제거함으로써 현역에서 떠난 병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일 텐데, 신경윤리학자는 이게 사회에 좋은 것인지 묻는다. 병사들이 화학적으로 기억을씻어내는 것이 사회에도 좋은 일인가? 혹시 양심 없는 병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발을 들여놓는 건 아닌가?
기억은 개인의 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제거하는 비즈니스는 눈여겨 볼만하다. 라이오 박사는 모든 병사에게 주는 것과 특별히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을 구분하려고 한다. 기억으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라면 약으로 인해 거짓기억 속에서사는 것이 자살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억은 양심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출전하는 모든 병사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경계를 인위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동료 인간에게 제대로 반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기억 말고도 우리가 시각을 통해 본 것을 재현하려고 시도하는 수준까지 기술이 도달했다고 한다. 피험자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피험자 대뇌피질의 시각 담당 부위를 관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우 버튼 중에서 어떤 것을 누를지 미리 알려고 하는 실험도 있다하니 거짓말탐지기를 능가하는 독심기계가 나오려나. 그러나 라이오 박사에 의하면 fMRI가 거짓말탐지기보다 더 신뢰할 만하고 예측가능한 도구인지는 모른단다. 한 여성이 fMRI의 근거를 증거로 남자친구를 독살했다는 혐의에 유죄선고를 받은 인도의 사례다. 마음을 읽는 기계에 혐의자를 강제로 묶어놓는 일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게 라이오 박사의 의견이다. 마치 DNA에 항복하는 것처럼 fMRI에 항복하라고 할 것인가? 반대로 피고 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뇌 스캔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근 부인을 창밖으로 내던졌다는 혐의를 받은 남성이 전두엽 종양을 보여주는 뇌스캔을 법정에 제시했다. 이 스마트한 변론으로 고의적 살인에서 고의없는 치사로 형량을 줄였다. 라이오 박사는 기술의 예측 정확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증거로 삼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유죄판결과 선고에서 피의자 유전정보 활용도 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폭력적 성향이라는 표현형을 나타낼 수 있는 유전형질을 보이는 유전정보가 범죄 입증 증거가 될 수 있겠는가? 혹은 선고 형량이나 가석방 시기, 조건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할때, 유전학적 진단과 유전학적 정보에 대해 대중과 공유할 전제에 대한, 뉴멕시코 대 법대 로버트 슈워츠(Robert L. Schwartz) 교수의 말은 유념할 만하다. 첫째, 인간게놈과 그 게놈을 소유한 개인의 유전적 구성의 발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다. 아직 과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원인보다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된 원인에 더 많은 비중을 주는 것은 무모하다. 둘째, 완전한 게놈 혹은 ‘정상적인’ 게놈이란 없다. 유전학적으로 인간표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유전정보 이용과 관련된 정책 토론이 사회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대중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뇌신경과학에 필요한 전제로 삼을 수 있을 만하다. 뇌신경 구조와 이것의 기능적 발현, 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다른 요인의 개입가능성을 떨칠 수 없고, 정확히 어떤 뇌구조와 기능이 정상이고 표준인지 알 수 없으니까.
강명신 교수는 연세대 치대를졸업했다. 보건학박사이자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다. 연세대와 서울대를거쳐 지금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의학 관련 기사를 통해미디어가 의학을 다루는 시선을 탐색하는 글로 독자를 만나고 있다. 생명윤리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