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대적 X-선 영상장치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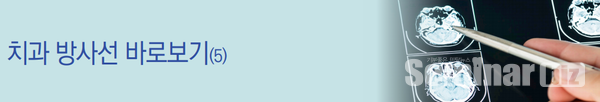
물체를 투과하는 특성을 가지는 감마선, 엑스선은 의학 및 산업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질병의 조기검진, 치료, 생산품의 품질관리, 비파괴검사 및 보안검색 등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특히 엑스선이 물질에 따라 흡수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체내부에서 발생된 질병의 진단이나 파손 없이 물체의 내부룰 검사 할 수 있다.
즉 엑스선을 물체에 조사한 후 반대편에서 그림자영상을 얻으면 물질의 내부조직형태가 반영된 투사영상이 얻어진다. 이와 같이 2차원적인 2D 그림자영상을 얻거나 다양한 방향에서 조사한 여러 장의 2D그림자 영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3D 영상을 얻는 엑스선 영상장치가 여러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엑스선 영상장치는 일반적으로 엑스선 발생장치와 영상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엑스선 영상장치의 원리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1. 엑스선 발생장치; 엑스선은 가속된 전자빔을 양극 타겟(Target)에 부딪혀서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원리로 엑스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엑스선 발생장치라고 총칭한다. 엑스선 발생장치는 전자빔을 만들 수 있는 전자원(電子源, Electron source), 가속된 전자빔을 급격히 감속시킬 수 있는 타겟, 전자빔이 움직이는 공간인 진공용기(眞空容器)로 구성된 엑스선 튜브와 구동을 위한 전원 및 제어장치로 구성된다.
전자는 음의 전하를 가지므로 전자원은 음극(陰極, Cathode)에, 타겟은 양극(陽極, Anode)에 위치시킨다.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빔은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압, 즉 관전압에 의해 가속되어 에너지를 얻게 되고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엑스선의 에너지가 결정된다.
발생된 엑스선의 에너지가 클수록 투과 능력도 커지므로 높은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빔에 의해 발생된 엑스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투과 능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치과 엑스선촬영 장비보다 전신 CT(Conventional CT) 장비에 사용되는 엑스선 발생장치가 더 높은 관전압을 가진다. 이러한 엑스선 발생장치는 가속된 전자빔이 없으면 엑스선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양극에 전압을 공급하는 전원장치의 스위치를 끄면 엑스선이 바로 차단된다.
따라서 전원이 꺼진 엑스선 발생장치 주위에는 외부피폭을 유발하는 엑스선뿐만 아니라 내부피폭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방사선 피폭의 우려가 없다.
양극에 사용되는 엑스선 타겟은 일반적으로 고에너지 전자빔에 의해 발생되는 열을 견딜 수 있도록 텅스텐(Tungsten), 몰리브덴(Molybdenum)과 같이 녹는점이 높은 물질이 사용되며 특정한 파장의 엑스선을 만드는 용도로 구리와 같은 물질도 사용된다.
전자빔이 가진 에너지의 1~2%만 엑스선으로 변환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열로 소실되므로 양극 타겟이 전자빔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발생되는 열이 상당하여 융용 점이 3,400℃에 달하는 텅스텐의 표면이 녹을 정도이다.
고출력 엑스선 튜브의 경우는 대부분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동일한 위치에 전자빔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양극 타겟이 회전하는 구조를 가진다.

엑스선 튜브는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빔이 양극으로 진행하는 동안 가능한 한 기체분자와의 반응이 없어야 하므로 반드시 진공이 유지되는 용기구조로 제작된다.
엑스선 튜브의 내부 진공이 용기외부에 설치된 진공펌프로 유지될 경우 개방형(open-type), 진공펌프 없이 밀봉된 구조로 유지될 경우 폐쇄형(closed-type)튜브로 구분된다. 주기적인 전자원 및 타겟 교체가 필요한 산업용 비파괴검사 장치에 적용되는 엑스선 튜브는 진공펌프가 달린 개방형으로 제작되기도 하나 의료진단 및 일반 비파괴 검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엑스선 튜브는 폐쇄형 밀봉튜브 형태로 제작된다. 음극에 장착되는 전자원은 외부자극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극에서 전자를 방출할 수 있게 한다.
엑스선 발생장치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자빔이 타겟에 얼마나 작게 집속되는가를 나타내는 초점크기(Focal spot size)이다. 일반적인 광학원리로 엑스선이 발생되는 지점인 초점크기가 작을수록 피사체의 그림자 영상의 해상도가 높아진다. 엑스선 튜브는 용도에 따라 초점크기를 크게는 1mm 이상, 작게는 1μm 이하의 크기까지 집속되도록 튜브의 전자빔 광학구조를 설계, 제작한다.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전압, 전류 조건에서 1mm 내외의 초점크기는 정전렌즈(Electrostatic lens)로 전자빔을 집속시킬 수 있으나 1μm 이하의 집속 빔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렌즈(Magnetic lens)가 사용된다.
2. 엑스선 영상센서; 뢴트겐이 엑스선을 발견할 당시 촬영한 아내의 손 사진이 최초의 인체 엑스선 사진이었는데 이때 사용된 것은 사진건판(寫眞乾板)이었다.
뢴트겐의 엑스선 발견 이후 현대의 디지털센서가 개발되기까지 오랫동안 엑스선 영상의 획득은 이 사진건판과 동일한 원리의 사진필름으로 이루어졌다. 엑스선 영상센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현상과정이 필요한 필름 스크린을 사용하는 AR(Analog Radiography)
2) 형광물질이 도포된 판과 스캔장치를 이용하여 현상과정이 필요 없는 CR(Computed Radiography)
3) 디지털 픽셀 어레이 구조의 DR(Digital Radiography).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AR은 엑스선 촬영 후 현상을 위해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판독을 위해 다시 그 필름이 의사의 손에 넘겨져야 한다. 현재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CR은 아날로그 필름 대신 엑스선을 흡수해서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하는 형광물질이 도포된 이미지 플레이트(Image plate)를 사용한다.
이미지 플레이트에 촬영, 저장된 영상은 언제나 스캔장치를 통해 디지털 영상으로 획득될 수 있고 동시에 이미지 플레이트에 저장된 영상은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AR의 필름과 달리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디지털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DR은 CR과 달리 스캔과정 없이 엑스선영상을 바로 디지털영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디지털센서를 의미한다. 디지털 센서의 영상획득 방식에 따라 간접변환방식과 직접변환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간접변환방식은 매개물질을 통해 입사되는 엑스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한 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이고는 직접변환방식은 별도의 가시광선으로 변환하는 과정 없이 바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매개물질로 섬광체(Scintillator)를 사용하는 간접방식은 변환효율이 높고 안정적이며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매개물질에서 발생한 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지기 때문에 공간분해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직접변환방식은 엑스선을 바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물질인 광도전체(Photo-conductor)를 사용하여 전자-홀 쌍을 발생시켜 직접 전기적인 신호를 검출하므로 공간분해능이 우수하여 영상품질이 좋지만 생산수율이 낮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직접 혹은 간접방식 모두 전기적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은 TFT(Thin-Film Transistor) 혹은 CMOS(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어레이가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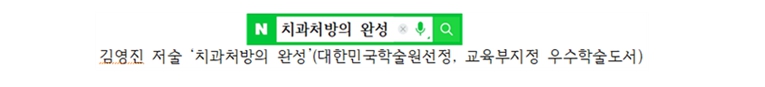

글_ 김영진 박사
조선치대졸업(1981), 동대학원에서 ‘치과방사선학’으로 석사, 박사학위 취득.
제 23회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제 30회 보건의 날 ‘대한민국국민포장’ 수훈
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