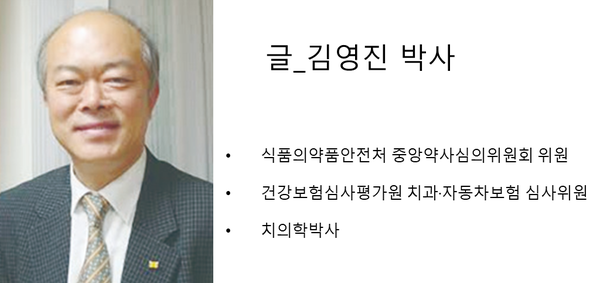작약(芍藥; 학명; Paeonia lactiflora)

작약(芍藥)에 관한 그리스 신화를 살펴보자. 머나먼 옛날 만물을 지배하는 여러 신들이 서로 싸울 때 ‘헤라클레스’가 저승에 들어가려고 하자 평소 ‘헤라클레스’를 못 마땅히 여겨오던 ‘푸르돈’이 저승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러자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푸르돈’을 활로 쐈다. 그의 화살에 맞은 ‘푸르돈’은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며 신들의 의사인 ‘패온(paeon)’을 찾아가게 된다. ‘패온’은 즉시 작약뿌리를 캐어다가 ‘푸르돈’의 상처를 치료해 완쾌시켰다. 그 이후로부터 신들의 의사인 ‘패온’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작약의 영문명 ‘페오니(Peony)’가 유래됐다고 전해온다.
중국에도 작약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이에 의하면 삼국시대였던 중국 후한(後漢)말 당대의 유명한 의사 ‘화타(華佗, 145년~208년)’의 집 주위는 온통 약초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모든 약초를 자신이 직접 먹어본 후에 스스로 효과를 체험하고 사용했으므로 결코 환자에게 잘못 쓰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화타에게 어떤 사람이 백작약 한 그루를 보내왔다. 화타는 그것을 정원이 보이는 창 앞에 심어 가꾼 후 잎을 뜯어 맛을 보았다. 그리고 가지와 꽃도 먹어보고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지만 맛이나 효력이 별다르지 않아서 약효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는 작약을 약초로는 사용할 용도가 없다고 생각해 작약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작약이 선녀가 돼 나타나는 꿈을 꾸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인이 부엌에서 식칼에 크게 다쳐 선홍색의 피가 바닥에 낭자했다. 화타는 각종 약초를 가져다 상처에 붙였으나 피가 멎질 않았다. 꿈에 작약이 선녀가 돼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화타부인은 그에게 작약뿌리로 치료해 볼 것을 권유했다. 화타는 부인의 말대로 작약뿌리를 캐어다가 상처에 붙였더니 즉시 피가 멎었고 통증도 가셨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처가 씻은 듯 나아 작약의 효능을 절실하게 체험하게 됐다고 한다.
작약의 학명인 ‘락티플로라(lactiflora)’는 ‘백색 꽃이 피는 정원의 화초’라는 뜻에서 시작됐으며 아리따운 소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작약꽃 속에 숨었다 해 ‘부끄러움’, ‘수줍음’이라는 꽃말을 갖게 됐다고 한다.
작약(芍藥)은 중국을 기원으로 중앙아시아와 남유럽을 원산으로 하는 다년초 식물(여러해살이풀)로써 속씨식물군(群) 범의귀목(目) 작약과(科)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꽃 모양이 화려하고 넉넉해 함박꽃이라고 불리며 예로부터 관상용 화초용도와 함께 중요한 약재로 재배됐다.
작약은 붉은색, 분홍색, 백색 등으로 꽃이 피는데 변종이 많아서 꽃 색깔도 다양해 백작약, 적작약, 호작약, 참작약 등 다양한 품종이 있다. 백작약은 높이 40∼50㎝로 밑 부분이 비늘 같은 잎으로 싸여 있으며 뿌리는 육질(肉質)이고 굵다.
잎은 3, 4개가 어긋나며 3개씩 2회 갈라진다. 소엽(小葉)은 타원형 또는 도란형(倒卵形)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6월에 피며 백색이다. 적작약은 뿌리가 붉은빛이 도는 품종으로 높이가 50∼80㎝이다. 뿌리는 방추형이고 근생엽은 1∼2회 우상(羽狀)으로 갈라진다. 소엽은 피침형, 타원형 또는 난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5∼6월에 피는데 백색, 적색 등 여러 품종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작약은 고려시대부터 재배된 것으로 추정되고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생산되는 약재로 기록돼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산림에도 자생하는 작약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마구잡이로 채취한 탓에 요즘에는 깊은 산중에서만 야생 작약을 만날 수 있다.
작약은 최근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재배하는 토종작물이다. 주로 전라남도 강진군과 장흥군을 중심으로 재배되는데 전국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외에도 강원도 홍천군, 경북 안동시, 경남 산청군 등 여러 지역에 작약 재배단지가 조성돼 있다.
생약학(生藥學)적으로 적작약(赤芍藥)은 뿌리가 길고 메말라 보이며 외피가 적갈색을 띤 것을 말한다. 반면 근구(根球)가 비대하고 외피가 백색인 것을 백작약(白芍藥)이라고 한다. 모두 약용으로 쓰이나 가격 면에서 적작약이 약간 높은 편이지만 수확량은 백작약에 비해 아주 떨어진다. 따라서 백작약을 재배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더 좋다.
일반적으로 식재 후 3∼4년 만에 수확할 수 있지만 수확시기의 결정은 뿌리의 발육상태와 생약시세, 질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수확은 9월 초순~중순경이 적기이다. 작약의 우량한 품질은 색깔이 외피는 담갈색이고 외부는 담홍색이며 떫은맛이 있는 동시에 약간 단맛이 있는 살찐 충실한 뿌리가 우량한 품질이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진통, 진정, 소염의 약재로 쓰며 부인병에 처방한다. 위장염과 경련성 동통에도 진통효과가 있어 많이 쓰인다.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소화장애 증상에도 유용하다. 작약 사용 시의 주의사항으로 산후에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복통과 설사가 너무 심할 때나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과량사용을 피해야 한다.
작약 추출물에는 paeoniflorin을 비롯해 albiflorin, oxypaeniflorin, benzoylpaeoniflorin,
oxybenzoylpaeoniflorin, lactiflorin, galloylpaeonoflorin, paeonin, paeonolide, paeonol, paeoniflorigenone 등이 함유돼 있다. 그들은 대부분 monoterpene 배당체이며 이들 성분 중 paeniflorin이 작약의 주요 약물효과인 항염효과(anti-inflammatory effect)와 면역조절작용(immunomodulatory effect)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작약추출물 중 paeoniflorigenone(PFG)의 항염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acrophage가 염증유발물질(LPS)에 자극돼 활성화(activation)되면 염증인자 NO를 생성하는 기전을 응용해 항염효과를 분석했다.
즉 LPS로 활성화된 macrophage에 PFG를 투여해서 NO의 생성이 억제되면 항염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PFG는 NO의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했다. in-vitro에서 이러한 항염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염성 관절염 동물모델을 사용해 PFG의 항관절염 효과를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PFG는 NO 생성억제와 T-증식억제 등에 의한 항염효과가 있는데 이 항염효과는 특정적인 염증질환의 일종인 감염성 관절염에 치료효과가 큰 것으로 규명됐다.
이처럼 PFG 성분이 C. albicans 기인성 관절염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발견은 기존의 감염성 관절염 치료에 새로운 대안물질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외에 대장조직 내 염증매개인자인 interleukin-6 및 cyclooxygenase-2 생성에 대한 작약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첫째, dextran sulfate sodium로 유도된 궤양성 대장염인 경우에서 유의성 있는 체중감소 억제효과가 확인됐다. 둘째, dextran sulfate sodium(DSS)로 유도된 궤양성 대장염에서 결장단축에 대한 억제효과도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셋째, DSS로 유도된 궤양성 대장염에서 임상증상인 설사, 잠혈 및 출혈 등의 질병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도 유의성 있게 질병활성화 정도를 억제했다. 넷째, 대장조직 내 염증매개인자인 interleukin-6 및 cyclooxygenase-2의 생성증가에 대한 작약의 억제효과도 확인됐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써 작약의 활용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작약추출물은 위장질환 뿐만 아니라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으로 일어나는 각종 부종이나 통증, 염증성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분야에 약리적 효과를 나타내는 작약추출물의 주요성분은 ‘파이오니플로린(paeoniflorin)’과 ‘파에오닌(paeonine)’, ‘페오놀(paeonol)’ 등이다. 배당체로서의 ‘파에오니플로린’과 알칼로이드인 ‘파에오닌’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며 항균작용도 있어서 황색포도상구균, 이질균, 용혈성연쇄상구균, 폐렴쌍구균의 발육을 억제시킨다.
특히 ‘파이오니플로린’ 성분은 진정작용, 진통작용, 해열 및 소염작용, 항 궤양작용, 혈압강하작용, 관상혈관확장작용 등을 나타내고 ‘페오놀’ 성분은 진통, 진경작용과 함께 소염 및 지혈효과도 보유하는 것으로 밝혀져 치약이나 구강세정제를 비롯한 구강용품에 사용된다.